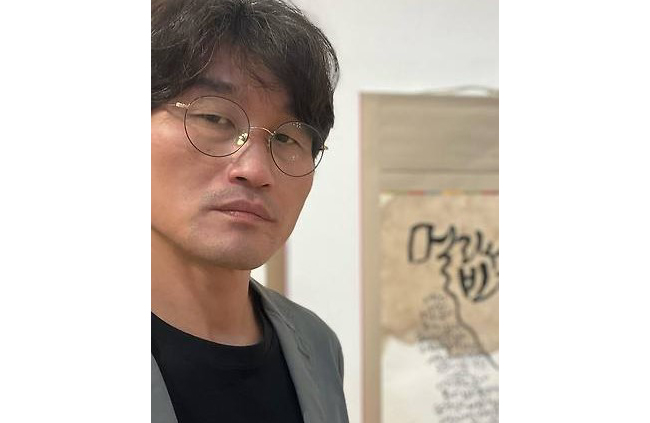
새벽부터 마을버스정류장에서 첫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줄이 길다. 이내 도착한 지하철로 옮기는 발소리가 요란하다. 플랫폼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지하철 안에 빈자리가 없는 건 고사하고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한다.
하루이틀 풍경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도 이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는 대략 알 수 있다. 시간당 10,030원, 월 209만 원. 이 지하철 안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매우 많다. 최저임금 통계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그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다.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 한쪽에서는 '올리라'고, 다른 쪽에서는 '올리지 말라'고 한다. 각자 자신들이 대변하는 집단의 입장을 주장한다.
현재 최저임금제는 노·사간 임금 협상에 정부가 개입해 최저 수준을 결정하게 돼 있다. 한 마디로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정부는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그럼에도 모든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 19.8%는 OECD 25개국 평균 7.4%의 2.7배에 달하며 멕시코의 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그 숫자조차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프리랜서, 택배,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온라인 기반 노동자 490만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추정할 뿐이다. 대형마트 노동자도 요양보호사도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그러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임금 인상'이 된다. 그래서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그 직종에 일하는 한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힘들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1명의 최저생계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한마디로 인간 답게 살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이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새벽부터 지친 몸을 끌고 나와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때우는 삶.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잿빛인 삶. 그런 삶들에 인간다운 삶이라 이름 지을 수 있을까. 지금 최저임금이란 단어는 인간다운 삶보다는 최저의 삶, 미래 없는 삶,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한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물가가 오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말은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이 이른바 '밥그릇싸움'을 하게 만드는 프레임이다. 대기업, 금융자본, 임대사업자 들은 그 싸움에서 빠져 있다.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게 만드는 말이다. 이른바 '개싸움'에서 둘 중 누가 더 힘들고 위태로운지 드러내게만 한다.
얼마 전 지역 취업박람회에 들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성별 불문하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자리들을 추려보니 쿠팡 물류센터 50개를 빼면 10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여기서 요양보호사와 특수 영업직 일자리까지 빼면 남는 건 60여 개다. 이곳에서도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일자리는 부족하다.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표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인간적 삶을 살 권리를 누리게 하는 데 있다. 희망 잃은 사람이 넘쳐나는 동네에 자영업자인들 희망이 있을 리 없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겨야 마을도 희망을 꿈꿀 수 있다. 고단한 노동이 아니라 즐거운 노동, 희망 없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즐기는 삶, 인간다운 삶을 만드는 '최저임금제'를 꿈꿔 본다.
마을기획 청년활동가 송형선은 사단법인 마중물 사무처장을 거쳐 현재 남동희망공간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아이즈앨범] 길고 긴 터널의 끝
길고 긴 겨울의 북풍 한설 끝에 봄이, 아주 벅찬 그리하여 완전한 봄이 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애태우던 절망의 그 절망이 사라지고 매화, 그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아이즈 앨범' 1999년 어느 겨울 새벽
아주 추운 어느 새벽 나의 밤의 미행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야박하게도 렌즈 노출이 3분을 넘어가고 있었다.파르르 떠는 몸의 파동과 온기를 나눌 연민의 차이처럼 찰라가 만든 결과 뒤 밀려드는 타자들의 고통이 어두웠다. 오늘처럼 쇄골이 시리면 생각나는 그 겨울 그 시간... *2001년 사진전, ...
'아이즈 앨범' 1999년 어느 겨울 새벽
아주 추운 어느 새벽 나의 밤의 미행은 계속되었고 갑자기 친구가 나타났다 외투를 벗어주고 싶었지만 야박하게도 렌즈 노출이 3분을 넘어가고 있었다.파르르 떠는 몸의 파동과 온기를 나눌 연민의 차이처럼 찰라가 만든 결과 뒤 밀려드는 타자들의 고통이 어두웠다. 오늘처럼 쇄골이 시리면 생각나는 그 겨울 그 시간... *2001년 사진전, ...
 얼어 붙은 땅에 노란 납매 그리고 동백
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얼어 붙은 땅에 노란 납매 그리고 동백
꽁꽁 얼어 붙은 날씨였으면 더 신기하고 감격으로 채워졌을 텐데...대한민국이 얼어붙고 혼란스러운 계절납매와 동백이가 핀 1월 따뜻한 봄을 기다려 본다
 [아이즈앨범] 첫눈이 말하는 폭설 이야기
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
[아이즈앨범] 첫눈이 말하는 폭설 이야기
큰눈이 내려주었다차는 차대로 엉거주춤사람은 사람대로 조심조심건물들도 내리는 눈에 모서리를 잃어간다모두가 흐려지는 날인데눈 녹은 자리에 다시 큰눈 내리고내리는 만큼 길이 질퍽해져도입가에 번지는 웃음이 있다첫눈이 많이 왔다는 말과 첫눈이 빨리 왔다는 말이 있다오늘 몇 시에 나왔냐는 물음과 퇴근길은 괜찮겠냐는 물음이 .

